영화 읽는 시간 [2025.11~12] 희망을 버리면 우리의 심장은 멈추고 말 것이다 <나의 올드 오크>

사람들은 언제 자신이 늙었다고 느낄까. 밤을 새고 일해도(혹은 놀아도) 끄떡없던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유행에 둔감해질 때 혹은 요즘 음악, 요즘 패션, 요즘 개그가 이해되지 않을 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믿고 싶을 때, 매년 돌아오는 건강검진이 두려워질 때, 약병과 병원비가 늘어날 때, 지인의 부고 소식이 잦아질 때, 그리고 이 대답을 끝도 없이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지금의 내 모습을 전지적 시점으로 느낄 때...


우리는 함께 먹을 때
더 단단해진다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온 영국의 거장 켄 로치 감독은 자신의 은퇴작 <나의 올드 오크>에서 영국에 도착한 시리아 난민과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통해 연대의 시급함을 이야기한다. 영화의 배경은 2016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2015년 영국은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시리아 난민 1만 5천명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2015년 터키 해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 배기 시리아 난민 아일란 쿠르디의 비극적 사진 한 장이 유럽의 난민 수용 정책을 바꾸도록 촉구했다. 켄 로치 감독은 2016년 시리아 난민이 영국에 이주하면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을 바라보며 <나의 올드 오크>를 만들기 시작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난민과 주민의 갈등이 아니라, 난민과 주민의 처지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데 있다. 소외되고 방치된 사람들, 경제적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의 처지 말이다.

“누구 맘대로 여길 와”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데리고 와” 주민들의 분노는 TJ(데이브 터너)가 운영하는 동네의 오랜 펍 ‘올드 오크’에서도 한바탕 길게 이어진다. 이들은 ‘우리 동네, 우리 거리, 우리 술집’에 발을 들인 난민들에게 거대한 적대감을 드러낸다. 그 적대감과 분노는 어디서 기인하는 것일까. 그들이 단지 난민이라서?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도 가진 게 없는데, 생판 모르는 이들과 나누라고?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런던의 부촌이 아니라 북부의 폐광촌에 난민을 떠넘기는 거지?” 펍에서 나누는 주민들의 대화에 답이 있다.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만이 난민에 대한 혐오로 전이된 상황이다. 주민들은 난민들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갈 것이라 걱정한다. 그런데 대체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의 것’은 무엇인가. 우리 마을, 우리 거리, 우리 술집? 애초에 그 공간의 주인은 누구인가? 만약 주인이 있다면, 그 공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주인 아닐까.
사진작가가 되는 게 꿈인 시리아 난민 야라(에블라 마리)의 카메라는 ‘우리의 공간’을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으로 만드는 데 일조한다. 또한 함께 밥을 먹으며 서로의 안부를 나누던 오래된 공동체의 기억을 일깨워 붕괴된 공동체를 다시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야라는 마을에 당도한 첫날부터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소중한 카메라가 깨지는 험한 꼴을 당한다. 그런 야라에게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인물은 ‘올드 오크’의 주인 TJ다. TJ는 사진에 관심이 많은 야라를 오랫동안 방치된 펍의 뒷방으로 데려간다. 그곳엔 마을의 역사가 담긴 먼지 쌓인 사진들이 걸려 있다. 30년도 더 된 광부들의 축제 사진이며 폐광에 반대하며 파업을 이어갔던 광부들의 모습까지,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엔 함께여서 든든했던 시간들이 아로새겨져 있다. 더불어 사진을 설명하는 강렬한 문구 하나. “함께 먹을 때 우리는 더 단단해진다.”(EAT TOGETHER, STICK TOGHTHER) 파업 당시 광부들은 매일 함께 밥을 먹었다. 함께 밥을 먹는 행위만으로도 단단한 결속을 이룰 수 있었다. 이 문구를 본 야라는 TJ에게 말한다. “우리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이에요. 시리아에 있을 때 우리도 늘 함께 밥을 먹었어요.”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한 식구라는 의미다. ‘말 대신 음식이 필요한 순간’이 있음을 잘 아는 두 사람은 이후 난민뿐 아니라 밥을 굶는 아이들, 방치된 아이들, 고립된 아이들이 다같이 모여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펍의 뒷방을 수리하고 단장하기 시작한다. “한끼 식사가 필요한 아이들을 돕고 싶어. 전쟁을 피해 우리 동네에 온 새 친구들을 따뜻하게 맞고 싶어. 같이 연대하는 거지. 무언가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것은 대단한 정치적 행위도 아니고 거창한 사회운동도 아니다. TJ의 말처럼 같은 장소에 모여 함께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이들은 친구가 될 수 있다. 불신과 적의와 패배감과 고립감을 떨쳐낼 수 있다. 그렇게 공동체는 다시 단단해질 동력을 얻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영화다. 물론 현실이라고 다를 것도 없다. 소셜 리얼리즘 감독이 호락호락하게 해피엔딩을 선물할 리도 만무하다. 현실에서 우리는 개인의 노력, 능력, 윤리, 도덕과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실패에 좌절하곤 한다.(당장 <미안해요, 리키>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떠올려보라) 그러한 실패는 우리를 손쉽게 패배주의와 회의주의에 젖게 만든다. 친구들의 배신을 쓰라리게 경험한 TJ는 공동체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려 한다. 하지만 그의 꺾인 희망을 되살리는 건 결국 사람이다. 상실의 아픔을 겪는 야라의 가족을 위해 소박한 꽃다발과 손 편지로 위로를 전하는 주민들의 모습에서 TJ는 그리고 우리는 다시 희망을 본다. 영화 속 대사를 빌려 표현하자면 ‘희망을 버리면 우리의 심장은 멈추고 말 것이다’.

영화의 마지막, 야라와 TJ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용기, 연대, 저항’ 세 단어가 새겨진 깃발을 높이 들고 행진한다. 이 행진의 이미지, 용기와 연대와 저항의 메시지는 전에 없이 밝고 따스한 빛 속에 자리한다. 이 빛의 스펙트럼에 적대와 배척, 혐오와 불신이 낄 자리는 없다. 아흔을 바라보는 거장은 국가와 시스템의 실패를 질타하면서도 건강한 공동체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세상은 잔인하고 불공평하지만 끝내 아름다운 것이어서 뜨거운 구호를 가슴에 품고 투쟁하게 만든다. “너무 아름다워서 다시 희망을 품고 싶어져요”라는 야라의 말처럼, 희망을 포기하는 순간 아름다운 것도 사라질 것이다. 타인을 수용하고 타인과 연계할 때 우리는 단단해진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공동체는 믿음과 희망과 연대가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21세기의 난민과 이주 문제는 공동체의 가치를 정립하고 우리의 용기와 연대와 저항을 시험하는 리트머스지일지도 모르겠다.
글 | 이주현(전 씨네21 편집장)
사진 | 네이버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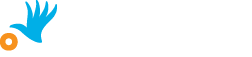


 페이스북 1
페이스북 1 트위터 2
트위터 2 카카오톡 3
카카오톡 3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4
네이버블로그 4  밴드 5
밴드 5
 해당호 목록
해당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