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읽는 시간 [2024.11~12] 만인의 자유와 평등, 그 자명한 진실 <링컨>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5일 치러진다(이 글을 쓰는 지금은 10월 중순이다). 제47대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선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는 막판까지 팽팽하게 경합 중이다.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해리스와 미국 역사상 최초로 형사 유죄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보유한 트럼프는 진보와 보수, 유색(아프리카·아시아계) 여성과 백인 남성, 검사 출신과 사업가 출신 등 여러모로 대척점에 서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은 중요하다.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살림살이가, 민주주의가, 인권이 다방면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미국의 두 대선 후보는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 상이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고 국경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트럼프는 이민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며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혐오 표현을 서슴지 않는다. 나와 너를 가르는 일, 다시 말해 나와 피부색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고 편 가르는 일은 분노와 적대감을 낳는다. 그것은 때로 전쟁의 씨앗이 된다. 실제로 미국의 남북전쟁이 그러한 이유로 발발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에이브러햄 링컨을 생각한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은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을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여든하고도 일곱 해 전에, 우리 조상들은 자유와 만인 평등이라는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해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세워진 이 나라가 오래도록 존속할 수 있을지 판가름하는 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연설은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끝난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상에서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장에 민주주주의의 정의와 가치가 모두 담겨 있다. 자유와 평등은 반쪽의 국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인의 것이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노예제 폐지에 힘쓴 링컨은 재선에 성공해 두 번째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미국 헌법 수정안 제13조의 통과에 온힘을 쏟아 붓는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링컨>(2012)은 바로 이 시기 링컨의 행적을 그리는 영화다. 시기적으로는 대통령 재선 2개월째, 남북전쟁 4년째에 접어든 1865년 1월. 참고로 1865년은 남북전쟁이 종식된 해이자 링컨의 생애 마지막 해이기도 하다.노예제도를 둘러싸고 남과 북으로 나뉘어 전쟁을 시작한 미국은 이미 피의 희생을 치를 만큼 치른 상황이다. 북부가 승기를 잡아갈 무렵, 링컨은 전쟁이 끝나기 전 노예제 폐지를 명문화한 헌법 13조 수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려 한다. 2년 전 자신이 선포한 ‘노예해방선언’이 그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헌법의 수정을 통해 영구적으로 노예제를 폐지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다수의 북부 백인들에게 우선순위는 전쟁의 조속한 종식이지 노예제 폐지가 아니었다. 이제까지의 상황은 ‘수정안이 통과되면 노예제는 폐지된다. 그러면 남북전쟁은 끝난다’였으나, 남부군으로부터 평화협상 제의가 들어온 시점에선 수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링컨을 면담한 국민은 이렇게 말한다. “제가 찬성하는 건 종전이에요.” 전쟁이 끝나는 순간 노예제 폐지 역시 물거품이 될 것이라 확신한 링컨은 수정안의 하원 통과를 위한 물밑 작업에 착수한다. 링컨과 공화당은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든 20표를 끌어와야 한다.

하원의원 토론 장면에선 거침없는 말들이 오간다. 민주당의 하원의원은 링컨을 이렇게 칭한다. “우리의 국왕 에이브러햄 아프리카누스 1세는 강탈을 일삼는 우리의 시저” “명령과 군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며 악랄하고 불법적인 노예해방선언으로 악명이 드높은 사람” 나아가 “여기 흑인에게 투표권을 줄 각오가 된 사람 있습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주게 될까요?” 마치 그런 날이 올 리 없다고 확신하는 듯한 발언이다. 아직 흑인과 여성은 투표권을 가질 수 없었던 시대, 자유와 평등이 소수의 전유물이라 여긴 사람들은 미래를 예견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부끄러운 수준을 드러낸다. 공화당의 급진파 의원은 “자연법을 모욕하는 건 노예제 그 자체”라고 맞받아치지만, 결국 ‘법 앞에서의 평등’을 넘어 ‘인종적 평등을 믿는다’고 말하는 건 당시로선 ‘급진적’ 사고였다.

이런 상황에서 수정안 제13조가 통과될 수 있을까? “인간 존엄성의 운명”이 달린 헌법 13조 수정안 투표 과정은 영화에서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으로 연출된다. 하원의장이 의원의 이름을 한명한명 호명하면 의원들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한다. 역사에 이름이 기록되는 기명투표 방식은 비장하기까지 한데, “미국에서 가장 순수한 사람이 추진한 19세기 가장 위대한 입법”을 지켜보는 일은, 역사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손바닥에 땀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이라는 하나의 종이기 때문이다. 링컨에게 만인의 자유와 평등은 유클리드의 공리처럼 ‘자명한 진실’이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틀림없는 진실. “출발점은 평등이야. 그게 정의지.” 링컨은 그런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했다. 그러기 위해 급진파와 정통 보수파 모두와 대화하고 협상했다. 또한 형벌이 아니라 관용을 베풀려 했다. 영화가 참고한 도서 <권력의 조건>에서 저자인 도리스 컨스 굿윈은 링컨에 대해 이렇게 썼다. “링컨은 죽음을 통해,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모든 이에게 자비를”이라는 두 번째 취임 연설문 한 구절의 화신이 되었다.” 영화 속 링컨의 마지막 모습은 어쩐지 희미하다. 그의 죽음은 꿈 같고 연극 같다. 링컨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에선 노예제가 폐지되고 5년 뒤인 1870년 흑인 남성들이 참정권을 얻었다. 여성은 그로부터 반세기가 흐른 1920년에 투표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한 세기 조금 못 미쳐 버락 오바마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카멀라 해리스는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 된 뒤 대권에 도전 중이다. 역사의 진보처럼 보이지만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했다는 불안은 팽배하다.
“시간의 씨앗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어떤 낟알이 자라고 어떤 낟알이 자라지 않는지 안다면 내게 말해다오.” 영화에서 링컨이 인용한 <맥베스>의 한 대사다. 이건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찌할 것인가. 주어진 씨앗을 정성들여 키우는 수밖에 없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자명한 진실에 부지런히 물을 주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의무일지 모른다.
글쓴이 이주현은 전<씨네21> 기자이자 편집장이다. 인권 영화 도서 「총은 총을 부르고 꽃은 꽃을 부르고.」를 썼다.
글 | 이주현(전 씨네21 편집장)
사진 | 네이버 영화, ⓒAFC PHO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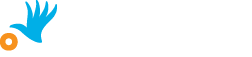


 페이스북 1
페이스북 1 트위터 2
트위터 2 카카오톡 3
카카오톡 3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4
네이버블로그 4  밴드 5
밴드 5
 해당호 목록
해당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