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로 보는 인권 [2024.03~04] 인권의 발견 한국전쟁이 남긴 것들
인권운동가로서의 첫발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인 1988년, 인권운동가의 길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때 처음으로 했던 일이 의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농성을 지원하는 일이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 의문의 죽임을 당한 아들 딸, 그리고 가족의 사건을 풀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던 유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유가족들은 낮에는 집회 현장 같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쫓아가서 의문사를 알리는 일을 하고는, 저녁이면 종로5가 기독교회관 3층에 돌아와 스티로폼 한 장 깔고 잠자고는 했다. 그때 유가족들을 인터뷰해서 의문사 자료집을 만들었다.

석연치 못한 죽음의 이면
가족들이 갖고 있는 자료들은 진정서와 사체 사진, 주검 사진들뿐이었다. 총 맞아서 죽고, 목매서 죽고, 익사하고, 분신 등으로 자살했다는 사체 사진들은 그야말로 피투성이었다. 하루 아침에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은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유가족들의 의심은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었다. 법의학 전문가가 아니라도 석연치 못한 죽음의 이면에는 뭔가를 은폐하려는 권력의 그림자가 짙게 배어있기 마련이었다. 그 농성으로부터 10여 년 뒤에 의문사진 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0년에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인권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공권력에 의한 죽음을 다루게 되었기 때문이었을까? 이후 나의 활동은 국가폭력 문제에 집중되었다. 고문 사건, 조작간첩 사건, 국가보안법 사건 등으로 이어졌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들었다. 왜 ‘국가폭력=국가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가? 왜 그런 국가범죄는 해결될 수 없는가? 세계적으로는 냉전질서가 해체되고, 국내적으로는 민주화가 되어가는 중에도 억울한 피해자들이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여전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했다.
곳곳에 널린 억울한 죽음
대전 동구 낭월동에서 충북 옥천으로 넘어가는 골짜기를 사람들은 ‘골령골’(보통 이 지역을 통칭해서 산내라고 불러서 산내 골령골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이라고 부른다. 원래는 ‘곤룡골’이었던 지명이 이렇게 바뀌어 불린 계기는 한국전쟁이었다. 북한 인민군의 남침에 의해서 맥없이 후퇴하던 한국군은 미군의 감시 속에서 한국전쟁 시기 대전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제주4.3사건, 여순사건 등의 좌익사범들과 대전과 충남지역의 보도연맹원들을 최소 세 차례 집단학살을 자행했다. 이곳에서만 7천 명 이상이 8곳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학살당했다. 무덤의 길이만 1킬로미터에 달해서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으로 불린다. 이곳이 골령골로 불려진 것은 이곳의 땅을 파면 유골이 수도 없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산내 골령골에서 유해발굴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한 적이 있다. 도로 옆 산 아래 자리에서부터 파들어 갔는데 그 깊이가 성인 남성의 키를 훨씬 넘었다. 너무 오랜 세월이 흐른 탓일까? 사람의 유골이라기보다는 나뭇가지나 뿌리가 땅에 박힌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뼈들이 흙속에서 드러나 있었다. 유골들은 몇 층으로 이루어져서 묻혀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묻은 그 위에 다시 시체를 던져서 매장했음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그때 학살 장면을 찍은 한 장의 사진이 떠올랐다. 긴 구덩이 안에는 이미 사람의 시체들이 가득했다. 그런데 그 구덩이 바깥에는 뒤로 묶인 사람을 엎어놓고 군인들이 군화발로 등을 밟고 있었다. 배를 땅에 대고 엎드린 그 사람들을 사살하기 직전의 상태, 그때 엎드린 청년이 고개를 돌려서 카메라를 응시하던 그 눈빛이 기억 속에 뚜렷이 떠올랐다.
‘골로 간다’는 말은 산골짜기로 끌려가면 죽는다는 뜻이다. 학살은 산골에서만 일어나지는 않았다. 바다건 강이건 어디건 이런 학살들이 일어났다. 한국의 산하에 이런 억울한 죽음들이 곳곳에 널려 있다. 보도연맹원을 예비검속으로 검거해서 죽였고,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를 죽였고, 부역자라고 몰아서 죽였고, 빨치산을 토벌하면서 죽였다. 북한의 인민군도 9.28수복과 1.4후퇴 시기에 학살을 저질렀다. 그리고 미군의 폭격에 의한 학살은 또 얼마나 많을까. 한국전쟁 중에 한국군 전사자는 실종자까지 합쳐서 16만 명 정도이고, 유엔군 전사자는 4만 명 정도였다. 그 피해도 엄청난 것이었지만, 군인 전사자보다 몇 배나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을 당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직후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 관련 사진자료. (KBS 대전방송총국 제공)
사진출처 : ©뉴스1(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410225)

2020년 11월 대전 동구 낭월동 일원에서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이 제9차 유해발굴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2020.11.2/
사진출처 :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051381)
하지만, 한국에서 학살은 한국전쟁 시기에만 일어난 게 아니었다. 제주 4.3사건에서는 제주도민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명 정도가 학살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여순사건에서도 3~5천 명 정도가 학살되었을 것으로 보이니 전쟁 전에도 학살은 자주 일어났다.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시기까지의 학살을 거친 뒤 남한에는 반공국가가 등장했다.
강요된 침묵
그런데 학살이 끝난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 자신의 가족이 학살당했다는 말을 꺼내는 것은 곧 또 다른 죽음이었다. 침묵은 강요되었고, 그 침묵은 이승만이 4.19혁명에 의해서 권좌에서 쫓겨나기까지 계속되었다. 4.19 이후 학살자 유족들은 전국적으로 유족회를 결성해서 ‘신원운동’을 펼쳤다. 그렇지만, 1961년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는 유족회 간부들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는 등 탄압을 가했다. 다시 침묵의 시간이 강요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이르기까지 근 40년 동안의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는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강제납치하고, 고문을 가했고, 조작해서 간첩으로 만들고, 죽이는 일들이 무수하게 벌어졌다. 박정희 시기에는 계엄령과 위수령, 유신 시기의 긴급조치를 발동해서, 전두환 시기에는 강제징집, 녹화사업 등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인권을 탄압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던 게 ‘빨갱이’란 낙인과 ‘국가보안법’이었다. 빨갱이는 단순히 사상이 불온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빨갱이이므로 죽여도 좋다는 살인 면허와도 같은 위력을 발휘했다. 그런 빨갱이 현상을 합법화한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1948년 12월 1일, 한시적인 법률로 탄생한 국가보안법은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사상범으로 처벌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가져와 만든 법률이다. 그 뒤 극단적 반공국가에서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법으로 군림했다. 독재자들은 중앙정보부-안기부, 보안사, 치안본부 대공분실 등의 폭압기구들을 통해서 국가보안법 사범들을 양산해냈다. 반정권 인사가 아니라도 누구든 잡아다가 간첩으로 조작해서 정권 보위를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악용했다. 국가보안법의 세계에서는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와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들은 들어설 자리가 없다. 아군 아니면 적군이라는 이분법만이 가능한 구조였다. 다양성이나 다원성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 위력은 대단해서 지금도 정치적 상대를 공격할 때는 빨갱이 또는 종북좌파로 공격하는 일을 종종 보게 된다. 국가보안법의 세계에서 상대방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해야 할 대상이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화폭력을 넘는 인권운동
극단적인 반공국가인 대한민국에서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가 시작되었다. 민주화는 국가폭력의 구조에 균열을 일으킨 획기적인 전환점이었다. 남한에서 인권운동은 국가보안법으로 구축해놓은 국가폭력 구조를 깨는 운동과 다름없었다. 모든 국가폭력의 원천이 되는 국가보안법 세계를 약화시키면서 다양성, 다원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운동이기도 했다. 민주화와 더불어 진행된 인권운동으로 비로소 우리나라에서도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같은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적인 가치가 힘을 얻어가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의 변화는 피해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가속화되었다. 민주화 이후 5.18 피해자들이 먼저 나섰고, 그 뒤를 따라서 조작간첩 사건, 고문사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 제주 4.3사건의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말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는 과거 독재정권에 의한 인권침해가 증언되기 시작되었던 시기이고, 그런 운동의 결과로 2000년대에는 과거청산을 위한 국가조사기구들이 설립되었다. 우여곡절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사건들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의 조사를 거친 다음 재심과정을 밟아서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과정을 밟게 된다. 국가폭력=국가범죄를 세상에 드러내고, 국가의 책임을 묻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국가의 폭력성은 점점 옅어지게 된 게 오늘까지의 과정이지 싶다.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 시기에 만들어진 극단적 반공국가의 후과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요한 칼퉁이 말한 문화폭력은 아직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인 공격의 수사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재난피해자들에게 가해지는 증오와 혐오에서 보듯이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엄연히 문화폭력이 재생산된다. 그 문화폭력은 한국전쟁이 만들어낸 광기의 언어들이다. 우리는 언제쯤 한국전쟁이 만들어낸 이 폭력의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한국 인권운동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글쓴이 박래군은 인권운동가로 4·16재단 상임이사,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로 일하고 있다.
글 |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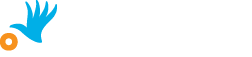


 페이스북 1
페이스북 1 트위터 2
트위터 2 카카오톡 3
카카오톡 3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4
네이버블로그 4  밴드 5
밴드 5
 해당호 목록
해당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