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말하다 [2023.11~12] #1 인권영화 감독 4인이 말하는 “2023년에 다시 본 내 영화”

지난 10월 초,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렸다. 전 세계 영화인들이 바다를 품은 도시 부산으로 속속 들어오고 국내 영화팬들도 아껴둔 휴가를 티켓처럼 꺼내 부산행 기차에 올랐다. 오랜 기간 부산영화제 스태프로 참여해 온 한 관계자는 부산을 아시아 영화의 중심에 우뚝 서게 하고 영화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지켜내 준 이들은 관객과 영화인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렇게 매해 영화제를 기다려 온 사람들의 열기는 부산의 구도심 남포동에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매해 다양한 영화 섹션으로 관객을 맞아온 부산영화제에는 관객과 함께 만드는 영화 축제인 <커뮤니티 비프>가 있다. 올해 <커뮤니티 비프>가 준비한 영화들을 살펴보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이런 문장을 발견했다. ‘커뮤니티 비프는 동시대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 펼쳐보아야 할 사려 깊은 해설서이자 관객의 활력과 에너지로 영화를 색다르게 체험하는 놀이터이기를 소망한다.’ 영화를 색다르게 체험하는 놀이터라고? 그렇다면 국가인권위가 20년간 만들어 온 인권영화가 바로 선언과도 같은 저 문장에 딱 부합하지 않나.
<커뮤니티 비프>팀과 인권위는 <달리는 차은>, <밤밤밤>, <청소년 드라마의 이해와 실제>라는 청소년들의 섬세한 감정과 서사를 [달리는 밤의 드라마]로 묶고,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 <잠수왕 무하마드>, <니마>라는 한국에서의 이주민의 평탄치 않은 삶은 [찬드라, 무하마드, 니마]에 담았다. 이 특별한 기획전에는 김곡, 윤성호, 부지영, 정윤철 감독들이 이야기 손님으로 나서 관객에게 당시의 연출 소회를 전하고 질의 응답을 이어 나갔다. “옛날에 만든 작은 영화에 누가 오실까 했는데, 혹시 동원되셨나요?” 라고 묻는 정윤철 감독의 농담에 관객들은 웃었지만 많은 관객이 다시 찾아주었다는 건 그만큼 인권 영화의 생명력이 길다는 반증이 아닐까. 당시 현장의 열기를 담아 감독들과의 1문 1답을 지면에 전한다. 사회는 전 씨네21 이화정 기자가 맡았다.
인권위가 만들어온 인권영화 프로젝트는 장편, 단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참여한 다양한 감독들이 각자 다른 연도에 만들었지만, 주제나 문제의식은 후대에도 주제별로 조합해 볼 수 있는 기획전이 가능할 만큼 다채로운데요. 이렇게 모아 다시 보니 소감이 어떠신가요?
윤성호 (청소년 드라마의 이해와 실제 연출) “맞아요. 세 편 모두 ‘이주’라는 주제지만 감독이 열심히 관찰해서 구성한 서사는 예언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태용 감독의 <달리는 차은>은 자원과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 폐지되는 지방 학교의 육상부와 다문화 가정의 애환, 그리고 이주민이 한국인이자 지역인으로 살아가는 어려움, 다가올 (새만금) 환경 문제를 그리고 있어요. 김곡, 김선 감독의 <밤밤밤>도 저 시절에는 교실에서 누군가를 괴롭히는 걸로 한정해서 그렸지만, 이제는 고스란히 소셜미디어 안의 괴롭힘으로 전이됐고요. 제 영화를 다시 보면서는 저 시절에 제가 얼마나 대중적인 스토리텔링을 싫어했는지를 깨달았어요. 어찌 보면 그걸 잘하고 싶은 열망의 반증이 아니었나 싶네요. 저 시절의 저는 픽션을 창조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서툰 작위를 싫어했던 거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어떤 약자의 정체성을 인위적으로 배치한 다음 따뜻한 결말, 감동적인 결말로 마무리 짓는 게 싫었던 거 같아요. 그런 고집 있는 편식은 어느 과정에선 필요할 수 있는데 편식 기간이 길었던 거 같아요. 제 영화를 다시 보면서 반성한 지점입니다.”
영화에 ‘동물원’이라는 괴롭힘이 등장하는데요.
김 곡 (밤밤밤 연출)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엔 동물원이라는 놀이가 진짜 있었어요. 남자애들 장난 같은 건데 “야, 쟤 기분 나쁘니까 2교시 끝나고 동물원 하자”라는 쪽지가 수업시간에 돌아요. 그러면 지목된 아이만 빼고 다 교실을 나가야 해요. 다 같이 나가서 혼자 남겨진 그 아이를 쳐다보며 창문을 두드리고 발을 구르는 겁니다. 처음엔 장난이지만 어느 순간에 진심이 돼버리죠. 실제로 학교에 성소수자라고 소문난 몇몇 친구들이 그런 피해를 당했어요. 그런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영화제에서 저렇게 3편을 모아 다시 보니 지나온 청소년 시절이 떠오르네요. ‘어, 나도 저랬었는데’ 싶은 연상 작용이 강력했어요. 그 시절의 환희, 열정, 우울, 기대가 다 섞여서 한 번에 떠오르니 영화 보는 동안 조금 괴롭기도 하더군요. 웃자고 만들었는데 말이에요. 윤성호 감독이 <밤밤밤> 안의 왕따와 폭력, 혐오가 지금 시대에는 온라인으로 넘어온 것 같다고 말했는데, 맞아요. 지금 뜨거운 문제임이 분명하죠.”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 <잠수왕 무하마드>, <니마>의 공통점이 있다면요?
정윤철 (잠수왕 무하마드 연출) “박찬욱 감독의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는 페이크 다큐이고, 제 영화 <잠수왕 무하마드>는 판타지이고, 부지영 감독의 <니마>는 아주 사실에 기초한 영화입니다. 모두 다 인권위가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적용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작품들인 것 같아요. 오늘 보니 주인공인 이주민들은 모두 자기 고향에서는 당당하고 존재감 있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니마>는 최근까지도 부지런히 소환되는 영화인데요.
부지영 (니마 연출) “많은 시간이 흘러도 소재나 주제가 낡지 않았다는 건 여전히 논쟁적인 주제여서인가 봐요. ‘니마’ 라는 몽골사람과 한국 사람이 모텔에서 함께 일한다는 설정이 저는 좋았어요. 함께 지내면서 가까이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영화 속에서 한국 사람 정은은 외국인 니마에게 업무도, 마음 돌봄도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런 뒤섞인 관계의 층위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인권위가 만들어 온 영화들은 돌아보면 한국 사회가 20년 동안 겪어온 사회적 사건들의 초상 같다. 어느 때는 부끄러운 우리들의 자화상이었고 어느 때는 위로하고 싶은 이의 뒷모습이었다. 15년도 더 전에 만들어진 영화들을 보자고 마치 개봉 날처럼 영화관을 찾아준 관객들. 그들은 인권영화를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로 ‘체험’하고 있었다. 그게 묘한 안도와 슬픔을 주었다.
글. 김민아(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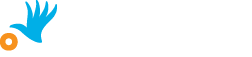


 페이스북 1
페이스북 1 트위터 2
트위터 2 카카오톡 3
카카오톡 3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4
네이버블로그 4  밴드 5
밴드 5
 해당호 목록
해당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