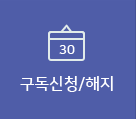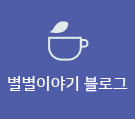영화 읽는 시간 [2023.11~12] 영화 <수라>를 통해 본 ‘미안한’, ‘고마운’, ‘소중한’ 이야기들
장르 다큐멘터리(108분) / 등급 전체 관람가 / 감독 황윤

어릴 때 나는 금강 둑길(군산하구둑~나포~웅포)에서 자전거 타기를 좋아했다. 칼바람이 가시고 박하사탕 내음처럼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봄의 문턱에 이르면 꼭 금강에 갔다. 해질녘, 갈대숲에 모여 있는 수천 마리의 철새들은 무엇을 하다가 언제 날아오르는지 숨죽여 지켜보곤 했다. 일군의 철새들이 먼저 날아오르면 뒤이어 수천 마리의 철새들이 줄지어 하늘로 향했다. 물결 위를 수 놓듯 비상하는 철새들의 군무를 보고 있노라면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영화 <수라> 속 도요새들의 군무와 갯벌의 경이로움은 그 시절을 떠오르게 만들었다. 영화를 보는 내내 군산 추억에 젖으면서도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 오동필 단장의 말처럼 이토록 아름다운 것을 본 것만으로도 죄인이 된 듯했다.

출처 : 네이버 영화 스틸컷
바다를 바라는 ‘수라’ 갯벌 이야기
새만금은 전라북도 군산부터 부안까지 33.9km에 이르는 방조제를 세워 바닷물을 막고 매립하는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1987년 대선 공약이었던 사업은 1991년 11월에 착수돼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2006년 방조제가 세워지면서 방조제 안쪽 담수에 바닷물이 들어가는 ‘해수유통’이 차단되자 어민들은 생업을 잃었고 바다 생물들은 바다 바라기가 되었다.
어릴 적 기억 속의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관광명소 중 하나였다. 바다 위 끝없이 펼쳐진 도로는 신기할 따름이었다. 여기저기서 새만금 덕분에 전라북도가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어린 나는 그 말만으로도 배가 불렀던 것 같다. 그런 갯벌에 그토록 많은 바다바라기 들이 살고 있을 줄이야. 갯벌에게 미안한 마음에 영화를 보는 동안 목이 멨다.
바닷물만을 기다리던 조개, 흰발농게들은 빗물이 바닷물인 줄 알고 흙 속에서 나왔다가 집단 폐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갯벌 생물들의 생명력은 대단했다. 염습지에서도 흰발농게는 그토록 오랜 시간 바다를 기다리며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매립토를 실어 나르는 커다랗고 시끄러운 덤프트럭 옆에서도 검은머리갈매기는 알을 품고, 새끼를 키워내고, 비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몸소 희망을 전하고 있는 저어새, 도요새, 검은머리갈매기, 흰발농게, 서해 비단 고동, 말똥게, 칠면초다. 이들이 사는 갯벌을 본 모습 그대로 돌려놓으려는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은 또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삼보일배를 하고, 쇠검은머리쑥새의 노랫소리를 기다린다. 자연 앞에 그들은 겸허한 조연이다.
그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갯벌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새만금 신공항 건설은 다시금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흰발농게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도 수라 갯벌에는 50여 종의 법적 보호종들이 살아가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야생생물들이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공동자산임을 인식하고 현 세대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 환경을 적극 보호하여 그 혜택이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그리고 국민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새만금 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 복합 용지로 개발·이용 및 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제, 갯벌을 살려야 하는 이유들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한 사회가 무너지기 전에 먼저 사람이 무너지고, 한 사회가 바로서기 전에 먼저 사람이 일어선다는 박노해 시인의 말처럼, 작은 물방울이 모여 강이 되고, 바다를 이루듯 함께 소중한 것들을 지켜나가야 한다.
당신의 ‘수라’는 무엇인가요?
<수라>를 연출한 황윤 감독은 “수라는 군산의 수라 갯벌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이지만, 우리 모두의 보통명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소중한 무엇인가를, 어떤 생명을 지키는 그런 보통명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각자의 수라를 지키면 모두의 수라를 결과적으로 지키는 것이기에 결코 지는 싸움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감독의 바람대로 <수라> 오픈 채팅방에는 영화를 관람하고 수라 탐방을 가는 이야기, 각자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나의 수라들’을 소개하고, 지키려 노력하는 이야기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영화에서 아버지 오동필 단장은 아들 승준에게 소중한 것을 지키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다. 영화 <수라>를 통해 나의 ‘수라’는 무엇인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수라’는 무엇인지 고민하게 됐다.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흰발농게와 도요새처럼 갯벌이라는 이름을 놓치 않으면 언젠가는 갯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내 고향 갯벌 ‘수라’는 언제까지나 영원할 것이다.
글. 김진희(국가인권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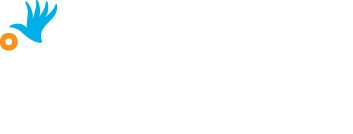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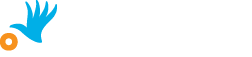


 페이스북 1
페이스북 1 트위터 2
트위터 2 카카오톡 3
카카오톡 3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4
네이버블로그 4  밴드 5
밴드 5
 해당호 목록
해당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