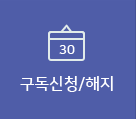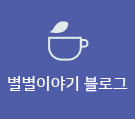세상,바로미터 [2023.11~12] 뉴스가 보기 싫은 나, 이대로 괜찮을까요?

나는 요즘 뉴스가 싫어졌다. 예전에는 종이 신문을 1부 이상 정도 정독했고, 공영방송 저녁종합뉴스를 실시간으로 보는 습관이 있었다. 매일 밤 지상파 3사 시사프로그램을 찾아서 봤고, 좋아하는 출근길, 퇴근길 시사프로그램이 있었다. 지금은 뉴스는 최소한으로 줄여서 본다. 포털에서 뉴스를 보지 않으려 애쓰고, 정제된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빠르고 간단하게 뉴스를 파악하고자 한다. 유튜브를 보지만 주로 강아지와 인권, 역사 관련된 콘텐츠만 본다. 뉴스 볼 시간이 있으면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며 책을 읽거나 OTT로 좋은 영화 한편을 골라본다.
뉴스가 보기 싫은 마음은 알고 보니 세계적 추세
처음엔 ‘뉴스보기를 직업으로 하다 지친’ 나만의 특별한 증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나처럼 ‘뉴스가 보기 싫어졌다’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다. 게다가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발간하는 <디지털 뉴스리포트 2022>의 핵심적 키워드는 뉴스 회피(news avoidance)였다. 뉴스에 대한 적극적이거나 의도적인 저항 혹은 거부를 뜻한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디지털 뉴스리포트>는 각국 뉴스 이용 현황과 인식을 조사·분석·비교해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협력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행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2 한국>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뉴스를 회피하는 이용자의 비율이 크게 늘었다. 조사대상 46개국의 ‘뉴스 회피’ 평균 비율은 69%, 한국은 그나마 그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67%였다. 연령대와 정치적 성향에 따른 ‘뉴스 회피’ 경향이 다른데, 다른 세대에 비해 2030세대가,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 이용자보다 진보성향 이용자가 더 뉴스를 회피하는 경향이 높았다. 뉴스를 회피하는 이유는 다양했다.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36개국 이용자들은 뉴스 회피의 주된 이유로 “정치/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주제를 너무 많이 다룬다”를 꼽았다고 한다. 미국, 영국, 그리스, 나이지리아 등 9개국 이용자들은 “뉴스가 내 기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를 꼽았다. 한국 이용자들은 유일하게 “뉴스를 신뢰할 수 없거나 편향적이다”를 뉴스 회피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고 한다.
한국 이용자들이 뉴스를 회피하는 이유로 꼽은 내용과 비율을 보자. ①뉴스를 신뢰할 수 없거나 편향적이다.(42%) ②정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주제를 너무 많이 다룬다.(39%) ③뉴스가 내 기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8%), ④많은 양의 뉴스가 쏟아져 지쳤다.(26%) ⑤회피하고 싶은 논쟁에 휘말리게 된다.(19%), ⑥시간이 충분하지 않다.(15%), ⑦얻은 정보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낀다.(15%), ⑧뉴스를 따라가거나 이해하기 어렵다.(11%) 순이다. 만약 지금 나에게 저 조사지를 주며 체크해 달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쓸까 매우 고민된다. 하나하나 모두 공감이 되는 말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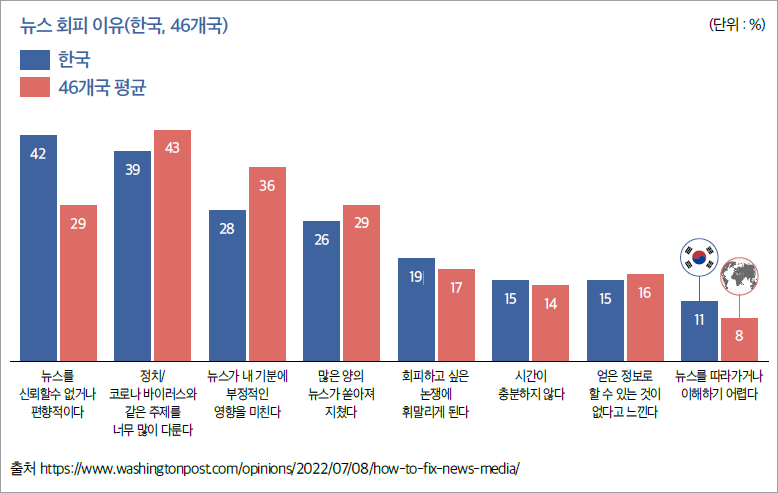
‘뉴스 회피’는 민주주의 존립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상황
그럼 어차피 세계적 추세가 되어버린 ‘뉴스 회피’를 우리 모두 대놓고 동참해도 되는 것일까? 그것이 우리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일까? 깊게 생각해보지 않아도 그렇지 않음은 자명하다. 뉴스는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주는 장치이다. 비록 지금의 언론 보도가 너무 과도하게 많은데 비해 정확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깊이와 품격이 떨어졌다고 해도 뉴스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치부할 수는 없다. 뉴스 회피가 심각해지면 국민의 정치 사회적 참여는 줄어들 것이고, 활발한 공론장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결국 특정 정치집단의 독주를 강화해 민주주의의 존립 자체가 위기를 맞을 것이다.
특히 인권의 관점에서 ‘뉴스 회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인권 감수성’이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매일 매일 벌어지는 세상 속 여러 사건·사고와 노동하며 생존하는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슈 속에서 토론하고 연대하며 깊어진다. 우리의 뉴스 기피가 심화되면, 누군가가 당하는 인권침해 현장은 이슈가 되지 못할 것이다. 함께 개선해야 할 수 많은 문제들은 공론장에서 배제되거나, 보도되어도 대중에게 전달되지 못할 것이다.
현재 ‘뉴스 회피’ 현상은 오히려 진보 성향의 이용자들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 2020년 발행된 벤자민 토프(Benjamin Toff)와 안토니스 칼로게로풀로스(Antonis Kalogeropoulos) 연구1)에서도 ‘젊은 개인, 여성,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의 사람들, 그리고 뉴스에 대한 내부 효능이나 신뢰도가 낮은 사람들’이 더 높은 비율로 뉴스를 회피한다고 분석했다. 공론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활발하게 사회를 개선시키고자 애쓰던 사람들이 아예 뉴스를 외면해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뉴스를 봐야 한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하다보니 ‘뉴스 회피’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조은희 교수2)는 “다매체 경쟁 상황 속에서 뉴스과잉은 회피를 낳고 언론의 신뢰 하락 또한 회피를 낳는 것”으로 보았다. “양적인 뉴스 피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허위 조작 등 질적인 문제도 회피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서 ‘뉴스 회피’의 요인은 매우 복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우리 언론에 많이 지쳤다. 뉴스를 신뢰할 수 없거나 편향적이다. 뉴스의 질도 떨어지고, 허위조작 정보도 너무 많았다. 뉴스를 볼 수 있는 미디어는 너무 많아졌고, 내가 찾지 않아도 알고리즘이 나에게 무차별적으로 많은 뉴스를 들이대고 있다. 비슷비슷하고 수 많은 정치보도가 쏟아져 나오는데도 지쳤다. 그런 뉴스를 읽을 시간도 부족하고 따라가기 버거워졌다. 그런 뉴스들이 나를 우울하게 하며, 회피하고 싶은 논쟁에 휘말리게 할 뿐이다. 또한, 사회의 문제와 현상을 고발하는 뉴스들을 봐도 내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뉴스를 봐야한다. 뉴스를 보지 않는 것은 참여민주주의의 붕괴를 가져오는 것이며 우리가 사는 환경에 대한 감시와 연대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맨다 리플리(Amanda Ripley)는 <워싱턴 포스트> 칼럼 ‘나는 뉴스 읽는 것을 그만뒀다. 내가 문제인가, 뉴스가 문제인가?’3)에서 △암울한 주제를 보도할 때 필수적 내용 외에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더 많이 전달하자 △기후 변화와 같은 이슈들을 다룰 때 언론사가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만 보도하지 말고 상황을 개선시킬 방법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자 △암울한 내용의 보도를 할 때 좀 더 공감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자고 제안했다. 공감되는 제안이다. 그러나 이처럼 기사를 쓰는 방식의 개선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닐 것이다. 매일 다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널리즘의 공간을 확보하고 미디어 공공성을 확보할 것인지 언론 정책에서부터 시작해 다양한 고민과 개선방안 제시, 실행이 필요해보인다. 당장 나부터 ‘뉴스 보기 싫다’, ‘뉴스 끊었다’는 말을 하기보다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내가 뉴스를 회피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언론의 변화를 견인하기 위한 본령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1) Toff, B., & Kalogeropoulos, A. (2020). All the news that’s fit to ignore: How the information environment does and does not shape news avoidance. Public Opinion Quarterly, 84(S1), 366-390
2) 조은희, <뉴스 피로, 가짜뉴스, 뉴스 이용 및 신뢰가 뉴스 회피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학연구, 23(3), 86, pp.49-87 Sep, 2023
3) <워싱턴 포스트> 2022년 7월 8일자 오피니언 칼럼. ‘나는 뉴스 읽는 것을 그만뒀다. 내가 문제인가, 뉴스가 문제인가?’
글. 김언경(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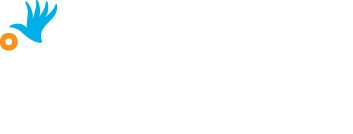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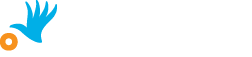


 페이스북 1
페이스북 1 트위터 2
트위터 2 카카오톡 3
카카오톡 3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4
네이버블로그 4  밴드 5
밴드 5
 해당호 목록
해당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