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읽는 시간 [2023.05~06] 얼굴을 보는 사람
박주영
「어떤 양형 이유」 「법정의 얼굴들」

외국인 보호소에 붙들려 있는 남자는 매번 족히 열 장이 넘는 편지(민원)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에 보내왔다. 중국어는 획수가 많아선지 길쭉한 글씨로 가득 찬 편지는 꼭 글자로 만든 대나무 숲 같았다. 민원 처리자는 그의 편지가 도착하는 족족 번역회사에 보냈다. 일주일쯤 지나면 그의 본심이 드러났는데 내용은 대체로 비슷했다. 자신은 여기 매여 있을 사람이 아니다, 여기 교도관들이 자신을 부당하게 감금하고 있다, 나는 할 일이 많은 중요한 사람이니 속히 풀어달라. 그는 갇혀 있는 답답함을 어느 날은 날씨로 풀었고, 어느 날은 조국의 역사로 풀어냈다. 그러고 몇 달이 지났다. 분명 그의 필체인데 이번엔 한글로 적힌 편지가 왔다. 그는 이렇게 써 놓았다. 나는 한글을 쓸 줄 안다. 그러나 한글은 내 모국어가 아니라서 미진하다. 나는 거침없이 말하고 싶다!
가나에서 온 한 외국인은 사업을 하다 한국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 나는 사인(私人)에 의한 침해는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도울 수 없다는 답변을 보냈지만, 그는 인권위가 사건을 일부러 처리하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틀림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뭐든 빨리빨리 하니까!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들의 업무와 처지라는 게 어느 기관이든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인권위 상담센터에 근무하다 보면 매일 적잖이 고통스럽고 경이롭다. 민원인들이 보내온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접수자는 판단할 수 없다. 다만 연필로, 볼펜으로, 자판에 꾹꾹 눌러 쓴 글씨 안에는 글쓴이의 생생한 감정과 자신만의 사실에 입각한 형편이 들어있다. 담당자는 그들이 처한 상황만 짐작해볼 따름이다. 대다수의 민원에는 안타깝게도 ‘인권위 조사 대상 아님’에 해당해서 도움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답변을 보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죄송한 마음도 잠시, 그들은 조만간 이렇게 나오신다. (탁자를 쾅쾅 두드리며) “감히 내 민원을 종결해?”, (상담실로 들어서자마자) “여자 말고 남자 나와, 여기 책임자 나와!”, (수화기 너머에서 직원과의 통화를 모조리 녹음했다고 겁을 주면서) “이거 다 까버릴 거야, 내가.”
나는 그제야 마음이 홀가분해진다. ‘그래, 그만 미안해하자.’
박주영 판사가 쓴 「어떤 양형 이유」와 「법정의 얼굴들」이 ‘우리 같은 사람’이 읽으면 도움된다고 동료가 말해주었는데, 솔직히 그때는 거들떠보기 싫었다. 내 마음이 지옥인데 사람들 욕도 못 하게 사려 깊은 작가의 글을 읽으라고? ‘아이고 됐네요.’ 그렇게 미운 마음이 모여 나는 서서히 차가워져 갔다.
해가 바뀌어 전보가 났고 나는 홍보협력과로 다시 왔다. 섭섭은 아니고 시원할 줄만 알았는데, 한동안 분리불안을 느꼈다. 머리 한쪽으로는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궁리하며 몸을 바삐 움직이는데도 다른 한쪽에서는 상담센터에 앉아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내가 보였다. 이게 뭐야, 아무래도 도망갈 수 없는 건가. 그제야 나는 「어떤 양형 이유」를 펼쳤다.
형사 재판을 하는 판사는 기소된 사건을 살펴 피고인에게 무죄 또는 유죄에 따른 형(刑)을 선고한다. 그가 잘하는 건 판단(判斷)이다. 그런데 판사 앞에 선 이가 곧 죄인이 될 거라면 그 ‘사람’은 어쩌다 그 지경에 이르렀는지에 관심을 가지는 판사는 어디에 있나. 타박이 아니다. 당연하지 않은가. 사물함만 열면 벽돌보다 더 두툼한 사건 철들이 쏟아진다. 판사에게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개인과 사회의 구조를 들여다볼 여유를 가지라고 요구하기가 어디 쉬울까. 가정폭력 범죄를 떠올려본다. 한때 그 가정에도 사랑이 깃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는 자기 집을 박살내버린다. 박주영 판사는 말한다. 법정은 모든 아름다운 구축물을 해체하는 곳이고 법관은 굳어버린 사랑을 발라낸 다음 가정을 이분도체, 사분도체로 잘라내고 무두질한다고. 법은 날카롭게 벼린 칼이고 법관은 발골사라고. 관행에 비추어 해오던 대로 판결하면 끝이겠으나 그는 양형 이유를 쓰며 기록에 스며든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피멍을 보고 어루만진다. 그리고 말한다.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학대하고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폭력으로 누군가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면, 그곳에는 더 이상 가정이라 불리며 보호받을 사적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폭력이 난무하는 곳보다 더한 공적 영역은 없다.”
여러 차례 소개된 적 있는 자살을 모의했으나 실패한 청년들에게 당부하는 글은 어떤가. 그는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보호관찰을 명한 뒤, 품에 넣어둔 ‘피고인들께 드리는 당부’를 주섬주섬 꺼내 이렇게 읽는다. 그 일부를 여기 적는다.
“보르헤스라는 작가는 우주를 도서관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우주가 도서관이라면 우주를 구성하는 우리는 모두 한 권의 책입니다. 한 번 시작된 이야기는 허망하게 도중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중략)… 저희는 이 사건을 두고 여러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결과를 막을 수만 있다면, 강제로라도 여러분을 장기간 구금해야 하는 건 아닌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재판을 하며 여러분이 삶의 의지를 조금이나마 되찾았다는 긍정적 징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선처를 호소했듯, 이젠 스스로 선처하고 아끼십시오, 잘 살아주십시오, 부디.” (법정의 얼굴들, 35p~36p) 청년들이 집으로 가는 길에는 용돈을 들려 보내는데 차비보다 조금 더 준다. 집에 들고 갈 조카 선물을 사야 하는 의무를 주려고 말이다.
판결에서 그가 드러낸 ‘감정’ 때문에 동종 업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도 하겠다. 그도 아마 수차례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성문 밖에는 쫓겨난 사람들이 그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그가 그말들을 신경쓸 여유가 있겠는가. 그들의 죄를 물으려면 그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들여다봐야하고, 그래야만 한 사람을 인화할 수 있는데 말이다.
법대 교수이자 판사이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겸임하고 있는 「더 리더」의 작가 베른하르트 슐링크는 서구 영화에서 몇백 번이고 변주돼 온 ‘홀로코스트’를 글을 읽지 못하는 한 여인을 통해 재현한다.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이 여인에게 모진 십자가를 지운 ‘읽는 사람들’은 끝내 자신들이 한 짓을 모른다. 그 사태는 참혹하지만 이야기의 전개는 서럽도록 아름다워서 문학이 아니라면 도무지 무엇이 그리할 수 있을까 싶다.
「어떤 양형 이유」를 다 읽고 나면 「법정의 얼굴들」도 곧장 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바람이 생긴다. 인권위 조사관들이 박주영 판사처럼 결정문을 써주면 좋을 텐데. 박주영 판사가 언젠가는 「더 리더」와 같은 법정 소설을 써주면 더 좋을 텐데.
글. 김민아(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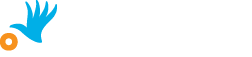


 페이스북 1
페이스북 1 트위터 2
트위터 2 카카오톡 3
카카오톡 3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4
네이버블로그 4  밴드 5
밴드 5
 해당호 목록
해당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