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2021.04] 노래하는 이도 듣는 이도 함께 행복하기를
글 서정민갑(대중음악의견가)

노래는 세상을 담는다. 아니 노래는 세상을 닮는다. 세상도 노래를 닮는다. 가령 2019년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알앤비&소울 음반 부문을 수상한데 이어 2020년에는 최우수 알앤비&소울 노래부문까지 석권한 래퍼&싱어송라이터 제이클래프(Jclef)의 노래 〈mama, see〉를 들어보자.
‘너무 흔해 빠져 메인이 될 수 없는 뉴스 속에는 우리네 차례가 아니었을 뿐인 소식들 / 그곳을 간신히 내가 피하면 족하다는 식으론 살 순 없잖아요 / 엄마, 세상이 이런데도 나의 웃는 얼굴만을 바라요 / 엄마, 세상이 커졌다는데 어떤 죽음만은 간편해요 / 난 셋의 딸의 엄마가 믿고 맡길 만한 세상을 바라요 / 엄마가 사나운 꿈을 꿀 일 없는 안전한 세상을 바라요’ 라는 노랫말 말이다. 이 노랫말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지, 어떤 세상이길래 이런 이야기가 노래가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2021년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랩&힙합 노래 부문을 수상한 스월비(Swervy)가 〈Mama Lisa〉에서 들려주는 ‘우리 엄만 말해, 나를 보고, 뺨을 한 대 맞음 목을 뽑고 와 / 반대쪽을 대야 할 건 너고, 용서 따윈 없지, 아냐, 여호와 / 인생이 신맛을 줘도 더 맵게 갖다 돌려줘’ 같은 노랫말도 마찬가지이다.
이 노래들이 갑자기 튀어나왔을 리 없다. 이 노래들과 최근의 페미니즘 리부트가 무관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노래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또 다른 노래가 있다. 가령 포크/민중가요 노래패 노래마을이 1993년에 발표한 〈일이 필요해〉말이다. ‘끝없는 집안일 반복 또 반복 / 그 중에 한 가지 먹는 일만 해도 / 하루에 세 번 일 주일에 스물 한 번 / 한 달에 아흔 번 일 년이면 천 번이 넘게 / 굴러 떨어지는 바윗돌을 올리는 / 시지프스의 노동처럼 / 여자라서 아내라서 여자라서 어머니라서 / 사랑의 이름으로 모성애의 이름으로 / 일 할 의무만이 남겨지고 / 일 할 권리는 사라져갔네 / 나는 일이 필요해’ 같은 노래가 있었기에 30년 뒤에도 꿈꾸기를 멈추지 않는 노래가 가능했을 것이다. 그 사이에는 [이야기해주세요] 시리즈 음반을 비롯한 노래들이 있었다. 싱어송라이터 지현이 2002년 발표한 음반 [逅 [hu:] 만나다]의 수록곡 〈아저씨 싫어〉도 있었다. ‘아저씨 그 다리 좀 오물려요 오우오우오우 / 아저씨 그 신문 좀 접어 봐요 오~우오~우 / 후끈거리는 허벅지 역겨워서 토하는 삶 / 펄럭거리는 신문지 내 신경을 끊고 있어 / 나 매일매일 지하철을 타고 다녀 / 쉬지 않고 나를 건드리는 놈들 / 이러다가 언젠간은 터지겠어 / 참지 않아 너를 죽일지도 몰라’ 같은 노랫말은 세상 어디에선가 누군가는 줄곧 눈 감고 입 닫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당연히 이 노래 전에는 또 다른 노래가 있었을 것이다. 그 노래는 한국의 노래이기도 하고, 다른 나라의 노래이기도 할 것이다. 같은 정체성, 같은 지향,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이들은 말과 글로만 싸우지 않았다. 춤과 노래와 그림으로 싸웠다. 영상과 시위로 싸웠다. 함께 보고 듣고 읽으며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에게 의지했다. 함께 변화하고 함께 나아갔다.
그 시간들을 이야기 할 때마다 상징처럼 소환되는 노래들이 있다. 한국으로 치면 〈아침이슬〉과 〈임을 위한 행진곡〉이다. 영미권으로 치면 밥 딜런(Bob Dylan)과 존 바에즈(Joan Baez)의 노래일 것이다. 사회운동이 가장 뜨겁게 폭발하던 시대의 노래들이다. 그래서 그 시절의 상징이 된 노래들. 하지만 운동이 한 시절 뿐일 리 없다. 모든 시대마다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운 이들은 수없이 많았다. 그들 곁에는 항상 노래가 있었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말하기 위해서는 노래가 필요했다. 생각과 예술과 행동은 선후를 나눌 수 없을만큼 연결되어 있기 마련이다.
한국에는 그 노래들만 집중적으로 부른 이들이 있었다. 그 노래들만 집중적으로 들은 이들도 있었다. 그 노래들을 민중가요라고 했고, 그 사람들을 운동권이라 했다. 예전 식으로 말하자면 전위이거나 선봉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이들이다. 하지만 맨 앞에 서지는 못하더라도 함께 걷기를 주저하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 뒤에서 묵묵히 따라가며 노래한 이들이 있었다. 칼과 창처럼 찌르는 노래들과 붕대처럼 상처를 감싸주는 노래들이 함께 있었다. 싸움은 찌르는 일만으로는 지속할 수 없었다. 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어야 했다. 더 많은 이들을 설득해야 했다. 때로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쏠 필요도 있었다. 그러므로 김민기, 노래를 찾는 사람들, 꽃다지, 안치환, 윤민석의 노래만 기억해서는 안될 일이다. 민중가요는 아니었을지라도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의 노래가 있어 인권을 사유하는 노래가 더 풍성해질 수 있었다.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래야 했다. 공감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세상을 바꿀 수 있었다. 세상에는 민주, 통일, 자주, 반미, 평등, 해방이라는 목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도 너무 많았다. 누군가는 새로운 시대의 문제를 노래해야 했다. 해일이 밀려오는데 조개나 줍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지만, 세상에는 조개를 줍는 사람이 있어야 했다. 조개를 줍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들이 해일이 되기도 했다.

만약 2009년 싱어송라이터 루시드폴이 [레 미제라블 (Les Miserables)] 음반의 첫 번째 곡 〈평범한 사람〉에서 ‘오르고 또 올라가면 / 모두들 얘기하는 것처럼 / 정말 행복한 세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 나는 갈 곳이 없었네 / 그래서 오르고 또 올랐네 / 어둠을 죽이던 불빛 / 자꾸만 나를 오르게 했네’라고 노래하지 않았다면 용산의 망루에서 싸우다 죽어간 이들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2016년 일군의 음악가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음반을 내고, ‘옥바라지골목, 요기가갤러리, 통영생선구이, 뽀빠이화원, 나무그늘, 경의선공유지, 테이크아웃드로잉’에서 노래하지 않았다면 그 즈음 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노래는 없었을지 모른다. 민중가요가 깃발처럼 나부끼던 시절을 지나,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이 세 명이나 대통령이 되었지만 세상의 한숨과 눈물은 그치지 않는다. 청년실업자가 울고, 비정규직이 울고, 성소수자가 운다. 자영업자가 울고, 빈민이 울고, 여성들이 운다. 그들 곁에는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사는 이들이 묵묵히 노래로 연대한다.
음반 사전 검열이 사라지고, 테크놀로지가 발전해 음악하기 좀 더 쉬워진 세상이다. 하지만 별처럼 빛나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음악인으로 사는 일은 고단하다. 청춘을 다 바쳐 갈아 넣어야 한다. 사생활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 방송사와 기획사의 요구대로 끌려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세상이 변하는 만큼 달라지지 않을 때 노래하는 일은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 된다.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편견과 폭력에 시달릴 때 누군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 이제는 노래가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만 물어서는 안된다. 노래하는 사람, 연주하는 사람의 마음과 삶에 대해서도,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눈길을 던져야 한다. 음악이 음악으로만 소비되지 않는 시대, 음악인들에게도 경쟁은 일상화되었다. 얼마나 간절하게 노래하는지 계속 드러내야 하고, 생존 게임처럼 경연을 펼쳐야 하는 시대에는 예술 역시 생존을 위한 전투일 뿐이다. 노래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계속 노래하기 위해서는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세상은 창작의 고통보다 더 많은 고통을 요구한다.
수많은 음악인들이 촛불문화제 무대에 서고, 사회적 현장에 연대하는 것은 자신의 삶이 다른 이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일지 모른다. 덕분에 우리는 다른 집회문화를 만들 수 있었고, 다른 목소리의 새로운 노래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자신의 노래를 갖지 못한 이들에게는 더 많은 노래, 더 다양한 노래가 필요하다. 다만 노래가 듣는 이들에게만 위로가 되지는 않기를 바란다. 노래하는 이도 스스로 위로가 되고, 노래를 통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세상이어야 하지 않을까. 누구에게나 인권은 소중하니까. 누구의 삶도 고단하기만 해서는 안되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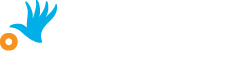


 페이스북 1
페이스북 1 트위터 2
트위터 2 카카오톡 3
카카오톡 3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4
네이버블로그 4  밴드 5
밴드 5
 해당호 목록
해당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