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2021.10] 과도한 친절은 사양할게요
글 최우리(한겨레 신문, 기자)
깻잎 트레이, 컵라면 박스 속 나무젓가락, 라면 묶음 포장

영국 상점의 로션은 포장이 왜 안 돼있지?
몇 년 전 가을, 영국 런던으로의 출장길이었다. 정신없이 하루하루 살다 보니 역시 비행기에 몸만 싣고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와 버렸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인간답게 만드는 화장품과 치약 등 생활필수품을 전혀 챙겨오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고, 한국의 올리브영과 같이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영국의 부츠에서 새 제품을 사기로 했다.
로션과 치약을 사려던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진열대에 올라온 상품이 새 상품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 한국에서처럼 포장이 뜯어지지 않은 새 상품이 있어야 하는데 포장된 상품이 없었던 것이다. ‘아니, 한국에서는 직접 써 볼 샘플이 있고, 샘플 뒤편으로 비닐 포장이 된 제품이 줄 서 있는데 이 선진국은 왜 소비자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건가’하는 불만이 샘솟았다. 의심 많은 소비자인 나는 한참을 제품 앞에 서 있다가 진열대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있던 로션을 집어 들었다. 열어보니 다행히 사용감이 없는 새 상품 같았다.
비싸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포장을 잘 하지 않은 걸까 생각해봤다. 그런데 좀 더 비싼 가격대의 제품을 판매하는 가방과 지갑 가게에 갔을 때도 반듯한 상자에 포장된 새 제품을 산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외국을 동경하거나 외국이 무조건 옳다고 말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외국에 오래 살아보지 않아 인상 비평에 가깝다는 한계도 인정한다. 다만 토종 한국인인 나는 외국의 상점에 진열된 물건을 처음 볼 때마다 ‘포장 참 대충했네’라는 생각을 자주 했다. 수년 동안 혼자 묵혀두었던 이 생각은 최근 탈플라스틱 운동과 제로웨이스트 문화 확대에 힘입어 한국의 소비 문화에 어떤 불편함이 있었다는 확신에 이르렀다.

플라스틱 트레이에 소분된 깻잎
깻잎을 왜 플라스틱 트레이에 담아야 했나요
코로나19의 2차 유행이 있던 지난해 8월 결혼한 뒤 직접 살림을 하게 되자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더 많아졌다. 결혼 이전, 즉 가정 내 쓰레기 처리가 내 몫이라기 보다는 어머니의 몫일 때에는 가격, 상품의 질 등이 중요한 소비의 기준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쓰레기 배출량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집 근처 대형 마트의 포장된 채소를 산 적이 없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채소를 듬뿍 넣어 채수를 내어 요리하는 걸 즐기고, 각종 나물 요리를 좋아하지만, 양과 포장 상태 때문에 마트에서는 채소를 구입하지 않는다. 우선 포장된 제품 대부분이 일주일에 요리라고는 한두 번 하는 2인 가구가 먹기에 양이 너무 많다. 지구 반대쪽에는 식량이 부족해 목숨을 잃어가는 지구인이 아직도 너무 많은데 힘들게 조리한 음식을 설거지통에 버리거나, 냉장고에서 썩게 하고 싶지 않다. 그렇다고 1~2인 가구를 위해 소분해 포장된 제품들을 사기도 꺼려진다. 간편해 보이고 깨끗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대체로 포장이 과하기 때문이다. 깔끔하게 비닐로 겹겹이 포장된 채소들을 보면 채소를 대신해 내 숨도 막히는 것 같다.
그나마 한 끼용으로 간단하게 비닐 포장되어 판매하던 990원짜리 깻잎마저 나를 배신했다. 원래 얇은 비닐 한장에 담겨있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플라스틱 트레이에 담겨나오기 시작했다. 며칠 전에도 대형 마트 앞을 지나다가 ‘오늘 요리에는 깻잎이 필요한데 동네 슈퍼까지 가자니 언덕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10분 이상 걸어가야 하는데 어떡할지’를 고민했다. 결국 그날 밤 깻잎 없는 요리를 해먹었다. 장바구니와 야채를 담아올 비닐을 챙겨가서 동네 슈퍼에서 파는 깻잎을 소량 사는 것이 그나마 친환경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동네 마트에 가려면 언덕을 오르락내리락하느라 힘이 들어 때로는 깻잎 먹는 것을 가볍게 포기했다.
물론 마트 깻잎이 트레이에 담겨 나온 이유는 유통, 보관 과정에서 깻잎이 상하는 일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일 것이다. 올해 초 한 식품기업 임원은 “환경단체가 주장하듯 플라스틱 트레이를 그렇게 쉽게 빼기가 어렵다. 유통 과정에서 제품이 손상되기라도 하면 소비자들로부터 쏟아지는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되물었다. 반년 동안 탈플라스틱 운동이 꾸준히 이어져왔고, 그 결과 최근 씨제이와 오뚜기 등은 즉석조리식품에서 플라스틱 트레이를 빼겠다고 답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불필요한) 포장으로 소비자를 안심시킬 수 있다는 기업의 (무의미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배경에는 ‘소비자들이 싫어하는 것은 피하고 하지 않는다’라는 자본주의의 법칙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씩 사도 여러 개 사면 묶음 상품 가격으로 할인해주세요
친절함으로 포장됐지만, 사실 기업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포장을 더욱 많이 하기 시작했다. 소비자도 번들 상품을 사는 이유도 하나씩 샀을 때보다 대량으로 구입할 때 가격이 더 싸기 때문이다. 라면 4~5개를 한 번에 담은 번들 제품이나, 질소 포장으로 빵빵하게 된 과자나 우유도 다시 테이핑을 하고 묶어서 묶음 상품으로 판다.
이제 소비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어왔던 기업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각성을 하고 자본주의의 한계를 쓰레기 문제에서 발견한 소비자들은 새로운 사회를 원하고 있다.
여러 개의 상품을 구입할 때도 번들 상품처럼 똑같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포장 쓰레기가 줄기 때문에 묶음 상품보다 개별 제품을 여러 개 사지 않을까. 나아가 포장돼있지 않기 때문에 장바구니와 보자기 등을 스스로 준비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씩 따로 사도 여러 개를 살 때처럼 할인 혜택을 주면, 서서히 모두가 장바구니를 들고 다녀 묶음 포장을 또 할 필요가 없다. 한 번에 많이 팔려고 하는 기업의 욕심과 귀찮은 것은 죽어도 싫은 소비자의 느긋함이 너도 나도 포장을 과하게 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특히 컵라면 6개 묶음 상품은 묶음 포장뿐 아니라 과잉 친절의 대표적 사례다. 컵라면 6개는 보통 종이박스와 비닐 포장으로 덮여 포장되어 판매된다. 컵라면 하나씩 따로 사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박스마다 나무젓가락이 다 들어있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다. 컵라면을 먹어야 하는 상황은 이해되지만 나무젓가락까지 꼭 세트로 들어있어야 할까. 과잉 친절을 베풀지 않으면 사람들은 알아서 적응하게 된다. 회사 탕비실에 쇠젓가락을 둘 수도 있고, 자주 외부에서 식사하는 사람이라면 각자 젓가락을 가지고 다닐 수도 있다. 외부 행사 때 필요한 컵라면이라고 해도 그건 참여인원만큼 나무젓가락을 따로 준비하면 된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던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배달앱들이 원하는 사람에게만 나무젓가락을 제공하도록 기본설정을 바꾸니 나무젓가락 사용량이 줄었다. 과거에는 일회용 젓가락과 숟가락이 기본으로 제공됐지만 이제는 받고 싶은 사람만 받기를 원한다고 체크해야 하도록 바꿨을 뿐이다. 무조건 절대 일회용품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회용품이 꼭 필요한 사람들만 받으면 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야외보다 집에서 먹는 일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시민들도 큰 불편함 없이 배달앱의 변화를 수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친환경적 실천을 하고 있는 시민이라면 “라면을 많이 먹으면 팜유를 얻기 위해 나무를 많이 없앨 수 있는데 라면을 꼭 먹어야하는가”라는 생각까지 하겠지만, 일단은 나무젓가락까지 넣지 않아도 소비자가 알아서 젓가락을 구해 컵라면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까지 사회가 편히 수용할 수 있어보인다. 소비자가 왕이라는 생각을 바꾸고 불편하면 불쾌하다는 인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추석 선물세트도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잖아요?
나의 경우 우선 지적질을 많이 하고자 한다. 추석 명절을 앞둔 마트에 진열된 선물세트들도, 지금은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포장이 깔끔하다. 마음을 담은 선물은 포장을 정성들여 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포장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콩기름으로 인쇄된 종이포장이라도 기능적으로 필요가 없는 포장은 아예 없이 선물을 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집에 있는 보자기나 손수건 등 또 사용할 수 있는 포장재를 이용해 포장을 하거나 장바구니째 담아 선물을 줄 때 받는 사람들이 더 좋아했던 것 같다.
지적하다 보면, 제품의 대량생산, 대량유통이 기본값이 되는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한 이런 포장 문화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동으로 펴지는 우산을 좋아하고 소분되어 나와 보관이 용이한 제품을 선호하는 동거인을 보면, 편리함을 포기할 수 없는 도시인들의 욕망을 기업은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자주 깨닫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도시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삶의 패턴을 바꿀 수 없다면 직접 소분해서 담아갈 수 있도록 신선한 야채를 제공하는 로컬푸드 제공이 가능해야 하고, 공산품도 지금처럼 하루 퀵배송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이 들고 값을 지불하더라도 보관과 유통이 용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현 체제에서 바꿀 것이 한두 개가 아니란 것을 깨닫는다. 폭증하는 쓰레기 문제 속에서 발견한 것은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낸 일상에서 놓쳐버린 다른 지구인들과의 공존법을 탐구하는 힘 그 자체일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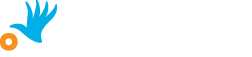


 페이스북 1
페이스북 1 트위터 2
트위터 2 카카오톡 3
카카오톡 3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4
네이버블로그 4  밴드 5
밴드 5
 해당호 목록
해당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