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도서관 [2020.06] 우리가 몰랐던 이웃의 이야기
글 안병훈 MD(교보문고)
인간은 익숙지 않은 것에 대해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낀다. 두려움은 곧 낯선 대상에 대한 혐오와 배척으로 이어진다. 우리와 다른 피부색과 언어를 지닌 난민 역시 우리에게는 낯선 존재다. 그렇기에 갑작스레 낯선 이웃이 되어버린 난민을 보는 시각은 달갑지 않다.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해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되돌아보자.
낯선 이웃
이재호 지음 / 이데아

2018년 500명이 넘는 예멘인들이 제주도에 입국한 것은 수많은 언론사의 이목을 끌었다. 이후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는 그들을 향한 온갖 혐오의 말이 쏟아졌다. 다른 생김새, 다른 언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채 아물지 못한 전쟁의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남겼다. 과연 그들은 우리와 다른 존재일까?
난민 지위를 얻기 위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2017년 기준 한국의 난민 인정률(2.0%)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아직 한국에는 난민에 대한 수많은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난민을 이주 노동자나 이민자로 혼동하지만 사실 그들은 고국을 떠도는 사람 가운데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고향은 젊은 남성을 납치하여 강제로 집총을 시키고 이를 거부하면 감금하거나 고문하고 심지어 살해하는 것이 현실이다. 간신히 입국한 난민 대다수는 3D 업종에서 일하며 성실히 세금을 내고, 문제를 일으키면 추방당할까 조용히 생활하고 있다. 우리는 난민을 가짜 난민, 입대를 거부한 젊은 남성, 국내 경제에 가져올 악영향, 그리고 난민 범죄를 언급하며 거부하지만 이는 편견에 불과하다.
예멘에서 온 난민도 2015년 자국에서 벌어진 내전을 피해 제주도를 찾은 이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 이 책은 난민 심사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편견과 혐오의 벽에 부딪혀 갈 곳을 잃을 처지에 놓인 난민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내 이름은 욤비
욤비 토나·박진숙 지음 / 이후

콩고민주공화국 반둔두 주 키토나에서 태어난 욤비 토나는 사바나 초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 대학교 졸업 이후 콩고비밀정보국에 몸을 담았다. 그곳에서 그는 당시 집권한 조셉 카빌라 정권의 비리를 최대 야당인 ‘민주사회진보연합’에 폭로하고자 했으나 발각되었고, 그의 삶은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다. 우여곡절 끝에 2002년 인천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하게 되지만 그는 잡혀갈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변변한 벌이가 없는 상황에서 ‘생존’해야 했다. 입국 당시 난민 신청자에게 발급되던 체류 허가증(G-1)으로는 취업을 할 수가 없었고 그는 생존을 위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과 강도 높은 노동, 차별을 견뎌야 했다. 그의 난민 심사는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대로 된 통역 없는 인터뷰로 불허 통지를 받기 일쑤였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콩고에 가서 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은 아브라함, 돈도 되지 않는 재판을 맡아준 김한주 변호사와 김종철 변호사는 큰 버팀목이 됐다.
이 책은 욤비 씨의 생애를 살펴보며 그가 겪었던 과정을 낱낱이 보여준다. 그 과정을 통해 난민이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차별과 혐오는 난민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놓는다. 대한민국도 19세기 이후 일제강점기, 6·25전쟁, 그리고 민주화 운동의 변화를 겪으며 수없이 많은 난민이 발생했던 국가였다. 고향을 잃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세계 각지에서 난민으로 생존했다. 현재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을 찾아온 난민도 조상과 언어와 겉모습만 다를 뿐, 똑같은 사람이다. 차별과 혐오로 난민을 대하는 것은 과거의 우리에게, 그리고 현재의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안병훈 MD는 좋은 책과 독자를 연결하는 일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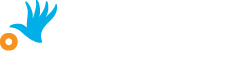


 페이스북 1
페이스북 1 트위터 2
트위터 2 카카오톡 3
카카오톡 3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4
네이버블로그 4  밴드 5
밴드 5
 해당호 목록
해당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