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2021.05] 〈미나리〉와 윤여정, 잔존 속의 낭만과 인권
글 이현재(문화평론가)

몸속에 스며든 시간
윤여정의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조연상 수상은, 55년이라는 평생의 세월 동안 자신을 배우로 다듬어 온 원로에게 늦게 도착한 보상이라는 감도 없지는 않다. 72년 김기영 감독의 〈화녀〉 이후, 홍상수 감독의 〈하하하〉와 임상수 감독의 〈하녀〉를 통해 칸영화제를 비롯한 해외 평단의 마음 한쪽에 ‘윤여정’이라는 이름을 상기시킨 뒤 거둔 10년 만의 성과이다. 그러니 우리는 ‘왜 하필 지금일까?’라는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다.
질문에 답하기 위해 〈미나리〉의 피날레를 돌이켜 보자. 자기 자신과 가족의 일생을 걸어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 정착하려던 주인공 ‘제이콥’(스티븐 연)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다.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준비한 농장은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하고 빚덩이로 전락했고, 아들 ‘데이빗’(앨런 김)은 고열로 생명이 위태해 보이며, 그의 세계에서 중심을 이루던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모니카’(한예리)와의 이혼으로 해체되기 직전이다. 그 와중에 아픈 몸으로 가족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쓰레기들을 소각하던 ‘순자’(윤여정)는, 자신의 실수로 제이콥과 그의 가족 에게 마지막 희망이었던 농산물 창고를 전소시킨다.
불타오르는 미래를 어떡해서라도 잡아보려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간 자녀를 뒤로 하고, ‘순자’는 어린아이처럼 울며 성치 않은 몸으로 어둠 속으로 도망친다. 짧은 순간이지만, 이 장면은 아마도 배우 윤여정의 필모그래피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일 것이다. 그 짧은 순간, 윤여정이 살아온 시간 속에서 몸으로 스며든 어처구니 없음이 응축되어 녹아 있는 듯 보였다. 배우 본인이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아하는 과거를 들추지 않더라도, 저 순간이 윤여정에게 채득된 시간이 빚은 개인적인 순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어렵지 않게 들었다.

순자의 따뜻한 말은, 어쩌면
급변하는 세상을 마주하며 생계를 견뎌야만 하는
까마득한 인생 후배들을 향한 응원인지도 모른다.
“나는 생계형 연기자예요”
감상에 근거를 간략히 들자면, 2010년 〈하녀〉가 개봉한 뒤 ‘씨네21’과의 인터뷰에서 윤여정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말을 참고해볼 수 있겠다. “나는 생계형 연기자예요. 연기자가 가장 연기를 잘할 때는 돈이 궁할 때예요. 배가 고프면 뭐든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배우의 필모그래피를 함부로 재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만, 윤여정이 걸어온 배우의 길 속에서 ‘매달렸다’고 표현한 단어에는 피택 속에 쌓인 것처럼 보이는 필모그래피가 있다.
윤여정이 쌓아 올린 필모그래피의 맥락을 되짚어보자. 윤여정은 본래 배우로서 커리어를 시작하지는 않았었다. 66년 T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여, 69년 MBC로 이적했다. 71년 MBC 드라마 〈장희빈〉에서 연기한 악녀 캐릭터로 인정받기 시작, 이를 통해 〈하녀〉를 찍고 거장의 반열에 오른 김기영의 눈에 든다. 같은 해, 〈화녀〉에서 주인집 남자주인공을 유혹하는 가정부를 연기하여 연기 인생 초반의 커리어하이를 찍었다. 이후, 72년 〈충녀〉에서도 인상적인 연기를 펼치며 거장의 인정을 받는 대배우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하지만 결혼으로 인해 자신의 커리어를 비롯한 생활 전반에 위기를 맞이한 뒤, 자신에게 남겨진 두 아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고백한 “생계형 연기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이 시기, 윤여정의 커리어를 이끌어준 동지는 김수현이었다. 김수현이 각본을 쓰고, 박철수가 감독한 〈에미〉(1985)를 시작으로 〈사랑과 야망〉, 〈배반의 장미〉, 〈사랑이 뭐길래〉 등 김수현이 각본을 쓴 드라마에 출연하며 캐릭터를 갈고 닦은 끝에 연기자가 아닌 배우의 자리에 되돌아 올 수 있었다.
이후, 윤여정은 다시 본인의 커리어를 발전시킨 중요 인물을 만난다. 임상수의 〈바람난 가족〉(2003)에서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노모 역할을 소화하며 대중과 평단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후 〈오래된 정원〉(2008), 〈하녀〉(2010)에서 〈돈의 맛〉(2012)까지 임상수와 꾸준한 호흡을 맞추며 해외 평단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된다. 이렇듯, 윤여정의 필모그래피는 우연한 만남을 기점으로 주요한 변곡점을 맞이해 왔다.
이렇게 본다면, 윤여정에게 ‘생계’는 자신 앞에 주어진 사고와 우연을 대처는 피동적이지만, 어쩔 수 없이 능동적이어야만 하는 아이러니한 수용적 자세를 함축한 단어처럼 보인다. 바로 이 아이러니가 앞서 말했던 ‘살아온 시간 속에서 몸으로 스며든 어처구니 없음’일 것이다. 그렇기에 필자에게 〈미나리〉의 ‘순자’는 윤여정이 본인의 일생을 돌아보며 세운 기념비와 같아 보인다. 혹은 갑작스런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직전 손주 데이빗에게 건넨 ‘심어놓으면 알아서 잘 자란다’는 순자의 따뜻한 말은, 어쩌면 급변하는 세상을 마주하며 생계를 견뎌야만 하는 까마득한 인생 후배들을 향한 응원인지도 모른다.

인간으로서 마땅한 권리 (Human Right)가 아닐까.
잔존만 남겨진 시대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절실한 가치란,
이 작은 낭만이라는 예의가 아닐까.
인권, 낭만이라는 예의
이제 가장 먼저 던졌던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었다. 왜 하필 지금인가? 필자는 ‘하필이면’ 2020년도 시즌에 윤여정이 역사에 남을 성과를 얻게 된 이유는 윤여정이 살아온 온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마주해야만 했고, 지금도 통과하는 중이다. 바이러스는 결국 모두의 부채가 될 것이고 그 인종이 누구든, 어디에 속했든 어떤 방식으로든 생계를 위협할 것이다. 그리고 혹자는 순자처럼 불구가 된 몸을 안고 남겨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 남는다는 말을 곱씹어 보자. 생존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차라리 잔존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려 보이는 단어는 〈미나리〉를 관통하는 주제이자, 영화의 중추를 이루는 핵심적인 주제이다. 사고와 우연 속에서 어찌저찌 배우라는 필드에 남겨진 윤여정이 일생 동안 느꼈을 피로는, ‘대봉쇄’라는 쉽지 않은 부채를 떠안게 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며 느낄 그 감정일 것이다. 그 피로 속에서 우리는 윤여정이 그랬듯, 살아남으려 어처구니없음을 견뎌 나가야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필자는 이것이 윤여정이 지금 정상에 도착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견뎌 나갈 생계는 서늘하지만, 순자는 영화 한켠에 낭만을 남겨놓았다. 그것을 트로피로 박제하는 일이란, 어떻게든 살아가야 할 이들에게 작은 낭만 혹은 희망을 남겨놓는 일이 될 것이다. 불확실한 생계 앞에 놓여진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인간으로서 마땅한 권리(Human Right)가 아닐까. 잔존만 남겨진 시대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절실한 가치란, 이 작은 낭만이라는 예의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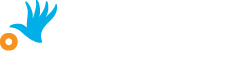


 페이스북 1
페이스북 1 트위터 2
트위터 2 카카오톡 3
카카오톡 3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4
네이버블로그 4  밴드 5
밴드 5
 해당호 목록
해당호 목록



